마은혁 임명 뭉갠 이유 있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없이 밀리면서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뭉갠 이유가 이런 상황을 의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을 임명할 경우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신속한 파면 결론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략적으로 임명 거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지금이라도 마은혁을 임명해 윤석열 탄핵심판이 파행으로 끝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엄밀하게 다듬거나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 절차적 문제 등 본질적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한두 명이 시간을 좀 끌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 헌재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게 '시간의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5대 3' 교착설입니다. 정형식∙조한창∙김복형 등 3명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선뜻 선고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상태로 윤석열 기각을 선고하자니 헌재 스스로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한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마냥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교착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진영에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보수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 인용 쪽으로 돌아설리 없다는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하지 않고 18일에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는 낭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체제가 2년 동안 유지될 거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자 애초 정권 쪽에서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한덕수는 당시 국회 선출몫 3명의 재판관(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는데, 여당 추천은 조한창 1명인데 야당 추천은 정계선·마은혁 등 2명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1명씩만 임명하고 진보색채가 가장 뚜렷한 마은혁을 제외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최상목이 보수진영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 지금의 헌재 늑장 선고로 이어진 셈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이들이 태연히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덕수는 직무에 복귀한 후에도 여전히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덕수를 기각한 것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법률 위반이 분명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국회가 마은혁을 선출한지 이미 석달이 지났습니다. 한덕수 손을 들어준 김복형 재판관 의견을 따르더라도 이젠 더이상 위헌·위법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헌재 안팎에선 최악의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6인 체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6인은 심판정족수(7인)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써, 헌재 마비의 시작입니다. 애초 마은혁을 임명했으면 이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덕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덕수는 즉시 마은혁을 임명하고, 헌재도 마은혁을 탄핵심판에 참여시켜 선고 지연으로 인한 헌재 마비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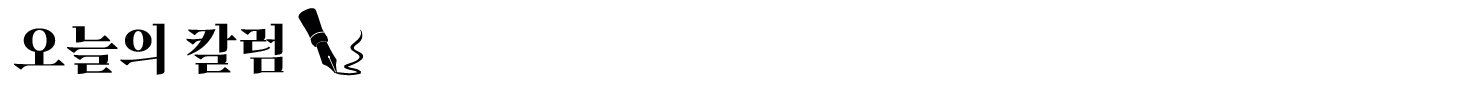
윤석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재가 헌정질서 문란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한겨레신문 이재승 논설위원은 내란 사태의 장기화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가치와 통념이 착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과 우파 엘리트들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이 내란 사태 장기화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정동칼럼] 최상목에게 국민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거셉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최상목의 개인적인 수익이 늘어나는 투자 수익구조라고 말합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