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묵은 대선책임론 이젠 접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2022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민주당의 해묵은 대선책임론이 진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데 대해 가장 큰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밝혔고, 다음날 이 대표는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패한 데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을 직접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진보진영에선 이를 계기로 윤석열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친문과 친명 간 갈등을 봉합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년 전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진 건 최근 문재인 정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를 직격한 게 발단입니다. 그러자 친명계에선 "이 대표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망가진 민심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애썼다"며 비명계가 진심으로 이 대표를 도왔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아치면서 상황이 격화됐습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훈장질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나서 대선에서 진 거야' 이런 소리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힐난한 것이 친문계와 친명계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대선패배 책임론 공방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당재편 과정에서 이 대표 추대론과 맞물려 제기됐고,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공천 과정에서 정권재창출 실패의 원인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친명계와 친문 등 비명계 간의 내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간의 회동을 통해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잇단 '반성문'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보수진영이 총결집 상태에 들어간 마당에 진보진영이 실익도 없는 대선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이다가는 조기대선 국면에 먹구름이 낄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반성의 메시지가 지난달 30일 두 사람 간의 회동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서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통합과 포용을 화두로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조기대선 일정이 구체화되면 경선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과 긴장이 다시 높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야권 잠룡들이 등장하면서 존재감 표출 및 결집 시도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당장 이낙연 전국무총리가 '윤석열, 이재명 정치 동반청산'을 주장해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고배를 마신 이 전 총리는 탈당해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당으로 출마했으나 민주당 의원에게 완패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끊겼다는 평이 많지만 이번에 다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돕니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좌우를 가리지않고 '통합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계파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경쟁이야 당연히 해야 하고 그게 시너지가 있다"면서도 "그분들에게 가능한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서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계파갈등에 대한 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가 13일 친문 진영의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하기로 한 것도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과의 회동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을 획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정권 출범을 막지 못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지지층 다수의 견해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갈등 해소와 통합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괄한 민주헌정 진영의 연대연합 구상이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란 세력의 철저한 단죄에 힘을 모으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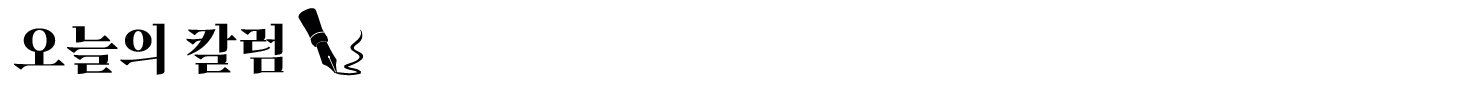
12.3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경향신문 서의동 논설실장은 북풍 공작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 어정쩡하게 앙금을 남기면 또 어떤 후환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생채기가 날 거라는 진단입니다. 👉 칼럼 보기
[뉴스룸에서] 쿠데타는 생명을 갉아먹었다
내란 트라우마는 사태가 종식돼더라도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신문 이정훈 사회정책부장은 1981년 스페인 군사쿠데타가 미친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영향을 들어 윤석열의 쿠데타가 미칠 충격을 적시합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민의 생명에 미친 폐해도 서서히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

